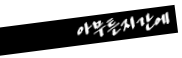길게 쓸 수도 있는 글인데 그냥 짧고 굵게 쓰고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아쉬우시다면 코멘트로 썰 풀어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수시로 위로 올라오는 (최신글로서 갱신되는) 글입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수요일 아침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영화관람권을 들고 강동CGV로 갔다. 조조 가격 5000원을 할인받은 셈이 되었다. 약간 아까웠다. 하지만 영화는 정말 좋았다. 히말라야라는 다소 클리셰적인 공간은 아쉬웠으나, 뉴욕, <LIFE> 사옥, 헬베티카,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의 청정하고 생생한 장면들은 정말 볼만했다. 이 영화는 코미디이기도 하다. 특히 애덤 스콧이 분한 구조조정 담당자 캐릭터는 "한 직장에서 16년간 수백만 장의 네거티브 필름을 관리했어도 단 한 컷도 잃어버린 적 없는" 묵묵한 모범사원이 항상 막연한 질투와 분노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방금 굴러들어온 개뼉다귀' 바로 그것이었다(쉽게 말하면, 내가 다 때려주고 싶었다). 월터의 상상 장면들 또한 내게는 굉장히 직설적인 코미디로 보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각자 할리우드 장르 클리셰의 한 가지씩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신은 로맨스, 어떤 신은 스릴러, 어떤 신은 무식한 블록버스터. ㅋㅋㅋㅋㅋ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월터에게는 상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에게 꿈만 같은(혹은 악몽과도 같은) 순간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부디 해외여행이라는 요소가 그런 순간들을 도와 줄 한 가지 방편으로서만 읽히기를 바랄 뿐이다. 국내전도여행 세 번, 해외전도여행 두 번, 혼자 다니는 여행을 두어 번 해 본 내게도, 그때의 전진하는 감각이 때때로 추억거리 내지는 삶의 다이나믹이 되어 돌아오곤 한다. 학원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닌 다음 다시 나답게(?) 공짜 조조표로 본 영화는, 뜻밖에도 내게 직장인으로서의 공감을 가져다줬고, 간만에 극장을 나오며 먹먹했다. 간만에 본 좋은 판타지였다. 좋은 판타지는 시청자의 가슴에 대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너의 삶도 이것만큼은 생생할 수 있지 않니?"
라바
GbusTV로 보면서 재밌게 본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만화는 진짜 못된 만화다. 이 애니메이션 특유의 미친 fps와 속도감은, 각 장면들을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감상자의 사고를 딱 그치게 만든다. 전체 줄거리를 말로 다시 설명하려면 그게 더 오래 걸린다. 그냥 보고 웃으면 되는 것이지, 누가 뭘 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서 뭘 했는지 일일이 살피고 인식하고 납득하고 공감할 여지가 없게 되어 있다. 심지어 옐로와 레드라는 등장인물 이름조차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라바를 보고 자라는 어린이는 분명히, 적어도 그 이전 세대보다는 더 심한 TV 바보가 된다. 웃었지만, 왜 웃었는지 자기 입으로 설명하지 못해 그걸 다시 틀어서 보여주고 상대가 웃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바보 말이다.
도로명주소
한국인의 위치 인식은 철저하게 지역군 단위이지 경로 단위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자체가 '동네' 위주로 편제되어 있다. 그러니 어떤 원주민도 자기가 어느 도로 위에(on which street) 사는지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게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 한국에서 "무슨 로 몇번 길 몇-몇"이란 주소는, 길 찾는 할머니에게는 물론이요 그걸 가르쳐줘야 하는 원주민에게도, 한국인 누구에게도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는 공허한 코드에 불과하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주소가 아니라 기존 지번주소와 우편번호와 각종 지도 어플리케이션의 합리적 개선일 뿐이다. 글쎄, 전국이 신도시 or 깡촌으로 완전 재개편된다면 모르겠지만, 신장로 218이라는 짧고 편리한 주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는 희대의 실패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연극 <불가능한 동화>
지인이 동명의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해서 아마추어 공연을 연다기에 마지막 무대를 일부 보았다. 1시간이 넘는 전반부의 연극 동안 연출진은 관객에게 느릿느릿한 템포를 즐겨 달라는 (또는 견뎌 달라는) 주문을 암묵적으로 계속하고 있었고, 관객들은 숨죽여 그걸 즐겨(또는 견뎌) 주었다. 15분의 인터미션 중 연극 진행팀은 관객을 전부 퇴장시키고(!!!) 극장 입구를 잠갔다. 뭔가를 열심히 준비한다는 모양이었다. 그 시간 동안 관객들은 멀거니 서서 또는 대기자 좌석에 앉아서 지금까지의 연극이 얼마나 길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바빴다.
Beautiful Life
iOS 7 이상이 깔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Apple ID를 미국 계정으로 로그인시켜 놓고 음악 기본앱을 열면 iTunes Radio를 들을 수 있다. 여러 방송국이 있고, 다음 곡 스킵 횟수와 이전 곡 다시듣기가 제한된 온라인 라디오가 장르별로 제공된다. 가요를 전혀 안 듣는 나로서는 미국 앱등이들의 아이튠즈 구매목록 위주로 생성되는 K-POP Station이라도 들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타이머 걸어 놓고 자기 전 재생시켜 머리맡에 두고 자곤 한다. 지금껏 그렇게 잠결에 이 방송국이 들려 주는 요즘(?) 노래들을 듣다가 귀가 솔깃했던 곡이 딱 두 곡 있었다. 우습게도 하나는 Block B의 닐리리맘보였다. instrumental이 괜찮더라. 그런데 다른 하나가 바로 이 곡이었다. 이 방송국이 용케도 최신곡을 틀어주었다 싶더니, 다시 찾아서 들어보았을 땐 잠결에 미처 다 듣지 못했던 감동과 눈물겨움이 속속이 배어 있었다.
지금 드렁큰타이거 서정권은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의 삶 자체도 파란만장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지나온 한 마리의 ‘술 취한 호랑이’는, 문득, 요즘 유행하는 힙합의 유행 조류 일체를 굳이 거절하고 그 대신 차분히 빛나는, 위로하는 듯한 음색을 선택한다. 자살률 1위의 이 나라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이전에, 우선 자기 자신이 위로받고 싶다는 듯이. 가사도 rhyme이 어떻고 플로우가 어떻고 하는 차원에서 완전히 초탈한 채 그저 이 한 마디를 두어 번 할 뿐이다. "니 맘을 조금 알아." MC스나이퍼가 컨트롤 대란의 풍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뒤 내놓은 신곡에서 "할 수 있어"를 아직도 그렇게나 힘에 부치는 라임과 특유의 냄새만 풍기는 소울로 억척스럽게 버티듯 외치고 있다면, JK는 전혀 힘을 주지 않는다. 'Monster'를 하던 그의 모습은 없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그는, 그냥 찬란한,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눈물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상하게도, 그들을 비웃을 의도는 없지만, 삶이 너무 고단해서 기운을 굳이 내고 싶지 않을 때 정작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명 래퍼'로 치부되는 이들이 생애를 쥐어짜서 토해낸 그 몇분짜리 무명곡들이다. 그들의 괴로움, 희망, 결연한 의지와 자부심 그리고 진실, 그런 것들이 먹먹하게 스피커 너머로 들리면서 숙연해지고, 위로가 된다. 거기에 후크와 샘플링과 믹싱이 좋아서 음악으로 흥을 얻기까지 하니 진정한 cheering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드렁큰타이거는 진심어린 cheering의 진수를 내놓았다. 개인적으로 타이틀곡 "살자 the Cure"보다 이 곡이 좋다. 니 맘을 조금 알아, 이 짧디짧은 괴로움과 진실의 응축 그것 때문에.
세븐갤
"세븐갤이 털리고 있다"는, "제대로 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어떤 비논리가 발생했다"를 뜻하는 사회적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