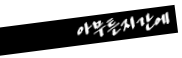이제 비가 좀 덜 내리게 되었으므로 그제야 그들은 거길 가볼 생각이 났다. 간밤에 그들이 사람을 죽인 곳을. 숫자로 말하자면 일가족 총 세 명을,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관악구 어딘가의 반지하에 세들어 사는 세 명을, 언론 보도를 인용하자면 '모 노동조합 지부장 모씨와 그의 언니인 발달장애인 모씨 그리고 그의 10대 딸 모씨'를 죽인 그곳을.
이동 중 그들이 보인 굳게 닫힌 입과 별다른 표정이 없는 그 얼굴은 언뜻 보면 최소한의 염치를 가진 일반인, 혹은 그 죽음에 대해 송구함을 표해야 할 입장인 정치인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근엄하게 생각했던 것이란 실은, 근데 관악구가 어디쯤이었지, 아 모르겠네 안 간지가 오래 돼서, 따위의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을 죽여 놓고도 그렇게나 태평했다. 아니지. 어떤 종류의 살인은, 제 몸과 제 정신을 완전한 거짓으로 둘러입고 사는 자만 할 수 있는 법이니까, 고쳐 말하건대, 그들은 그렇게 내내 태평할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오와 윤은 거의 동시에 그 자리에 도착했다. 둘 다 같은 검은색 신사용 대형 우산을 직접 들고, 노란색 윗옷을 입고 현장으로 조심조심 다가갔다. 그 자리에 가까워올수록, 안 그래도 축축한 골목에 비가 다 마르지 않아 더욱 질척거리는 듯한 땅과 공기, 그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현장을 보존하고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는 일선 경찰과 공무원들, 그 모든 갑자기 낯설어진 주변을 걱정스럽게 구경 나온 주변 주민들, 그들이 뿜어내는 인열 등등에 대해서, 윤도 오도 거의 동시에 이맛살을 찌푸렸다. 반사적으로, 그 어떤 악의도 없이, 받은 메스꺼움을 그대로 뱉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들의 평소 습관대로.
서성이던 윤과 오는, 그 주변에서 상황을 설명하던 공무원에게 다가가서 가만히 경청하는 것으로, 그 심리적 알리바이 형성 작업에 착수했다. 그 설명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뿐이었다. 하지만 그걸 모른 체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기실 바로 그것, 모르는 체하기야말로 그들의 유일한 천부적 재능이었다. 그들이 그간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며 그 나이가 되도록 이렇달 굴곡 없이 출세가도를 타고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재능을 십분 발휘하여 기득권층으로 편입한 덕분이다. 계획적인 살인범은 공모자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들은 다른 살인범들이 꼬드겨 세운 공모자였고, 이제 그들 자신도 경력 살인범이 될 참이었다. 차라리 그 자리는 자격 시험에 가까웠다.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게 모르는 체를 해야 했다.
오는 그래도 비슷한 걸 몇 번 해 본 입장이었지만, 윤은 이런 종류의 시험이 처음이었던지라, 아무래도 그렇게 속단했던 거 같다. 이거 너무 쉬운 거 같은데. 그냥 적당히 걱정해 주는 말이나 해 주고 혀나 좀 차 주고 명복이나 빌고 가면 되겠구만. 속단한 것은 속결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윤이었으므로 그는 그 주변에 나와 있던 다른 주민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넌지시 혼잣말처럼 말을 걸어 물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미리 대피한다는 게 가능한 줄 아느냐, 15분도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모든 게 급변한다, 순식간에 땅이 꺼지면서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는 걸 모르느냐" 같은 말이 들려왔지만 윤은 전혀 듣지 않았다. 자기가 말했고 상대방이 반응했다. 그러면 대화는 성립한 것 아닌가.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오는 그걸 옆에서 바라보며 내심 걱정했다. 이러다가 우리가 범인인 걸 들키는 건 아닐까 하고.
윤은 내친김에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말도 더 해 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대피하고 싶어도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게 되기 때문에 못 나간다" 하는 누군가의 고성이 끝나가고 있었어서, 그걸 요령 좋은 반말로 뚝 부러뜨리고, 거기에 제 말을 찔러넣었다. 아 문이 안 열려서? 아니, 어제 엄청났던 것이, 서초동에 우리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이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수될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도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 그러니 뭐. 제가 있는 아파트가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정도니. 그건 분명, 제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보아하니 참 힘들어 보이던데 당신들도 참 힘들었을 거 같고 여기 사셨던 분도 참 힘드셨을 거 같다, 하는 소리를 한다고 한 셈이었다. 무식해 보이리만치 무모했을지언정 틀리지는 않은 연기였다. 어떤 비전문가가, 살인범이, 자기가 죽인 사람을, '힘들었겠다'고 공감해 줄 거라고 믿겠는가.
오는 이쯤이면 됐으니 적당히 다시 자리를 뜨고 싶었다. 적당한 곳에 숨어서 뉴스를 지켜보며 자기가 다시 나서도 되는 시점을 골라야 했으니까. 하지만 윤은, 자기의 범행 현장에 처음 와 본 살인자답게, 현장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시 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어느샌가 그의 발걸음은 그 반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말렸다. "여기는 아직도 여전히 사비로 양수기 써서 물을 퍼올리고 있다. 지하에 6가구가 살고 있다. 당신을 들여보내도 좋은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제야 그는 마지못해 층계참을 좀 지난 애매한 위치에 엉거주춤 주저앉아서는, 뭐라도 한 마디 할 생각으로 그 계단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보통 사람은, 아니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의 범인이 아닌 이상에는 누구도 결코 느껴볼 일이 없는 대단히 특별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 그런가. 이게 여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렇군. 여기가 지금 저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군. 그런 거군. 그러면서, 그는 별 말 없이 그 자리에 잠시 쪼그려 앉아 있었다.

이 이상 현장에 다가갈 수는 없다는 공무원의 제지를 받으며 윤은 끌려나오다시피 그 계단을 벗어나 건물 밖으로 인도되었다. 사실 이제 용건은 더 없었지만, 아직 그들은 정말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윤의 입장에서는, 그 세 사람이 실제로 죽어가던 그곳의 정취를 아직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그 반지하방 안을 볼 방법이 있는지 찾고 싶었다. 아마 윤이 '창문으로 탈출 못하나?' 같은 멍청해 보이는 질문을 해서 유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오와 윤은 그 창문 앞으로까지 안내를 받았다. 그들의 얼굴이 그 창문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어둠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들여다보여지는 저편 방향에서는 역광에 비친 그들의 몸뚱아리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고, 그 속에서마저 그들의 퍼런 안광이 번뜩였을 것이다.
둘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당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안을 바라보기 바빴다. 겉으로야 티가 안 났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그들은 더할 나위 없는 은밀한 흥분을 감추며 그들이 살인을 자행한 곳의 진짜 광경을, 그것도 낮밤을 바꾼 시간대에, 어떤 고소, 고발, 탄핵소추, 주민소환, 용의선상 조사 취조도 받지 않는 자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런 순간 정도에만 진실로 감각하고 경탄할 수 있었다. 자기가 안전하고 정당하며 우월하고 결백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는 저 자리에서 죽어나간 사람도 아니고, 저런 어둡고 지저분하고 쿰쿰한 곳과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곳에서 죽을 만한 사람을 죽여 줬을 뿐이라는 것을.
한동안 그런 비정상적인 감각에 도취돼 있다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정신이 들었다. 아마도 그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쪼그려앉아 그 안을 들여다보느라 다리가 저려 와서 그랬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이 현장을 뜨자는 뜻에서, 서로 간단한 눈빛만 주고받은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 창문 앞에서 시바이를 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이건 남 일이라는 듯이, 내 일이 아니라는 듯이, 잘은 모르겠지만 참 안됐고 그러니 이건 절대로 내가 죽인 건 아니라는 듯이.
야 이거 참, 왜 대피를 못 했을까. 그러니까요. 왜 대피를 못 했을까요. 햐 참 진짜 이거 반지하가 문제야. 여기는 지대가 낮으니까 이게 다 직격탄 맞잖아. 서울시가 반지하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이제 금지시키든가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우리는 저기 그런 거 없나? 강수량 측정해서 국민들 알려주는 앱 같은 거 없어? 그런 거 좀 만들라고 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