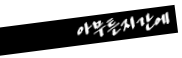이 영화를 성남시민회관 소극장까지 가서 봤습니다. 첫째는 무료고 시간도 얼추 들어맞는다는 이유, 둘째는 알고 보니 성남시 최대 현안이 시립병원 건립이라는 이유.

생각해 보니 중학생 때 여기서 웅변대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찾은 소극장은 너무 좁았습니다. 한 시간쯤 미리 도착해 보니 상영 테스트 중.

이때만 하더라도 흑백인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넋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의료보험증 나오는 장면 때 찍음.

성남시 공동체상영을 주관한 주최측이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대기를 탄 다음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사회를 보시는 분이 잠시 소개를 한 뒤 상영을 시작하려는데

이게 웬걸 DVD 재생환경이 어째 흑백인 듯해서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냥 흑백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삭제)
이 분을 비롯한 현직 의사들은 내가 왜 가운을 입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사람 살리는 곳이니까 죄책감 내지 불쾌감이 덜하다는 자위.
(삭제)
이 할아버지는 받아야 할 치료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미국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흑백으로 나온다고 해서 과거 이야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영화를 흑백으로 본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보다는 노인들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좋은 카메라로 생생하게 찍힌 컬러였다면 더욱더 구역질 날 만한 것이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끔 나오는 수술 장면이나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등장인물들의 방구석들을 보면 말입니다.
(삭제)
이 할머니는 관절염이 도졌습니다. 역시 비싼 병원비 앞에서 뾰족한 수도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분은 관절염이 의료보험 제외 대상이어서 제대로 된 혜택도 받지 못하고 비싼 병원을 쳐다볼 뿐입니다. 감독이 묻습니다. "근데 할머니, 의료선진화라고 아세요?" 할머니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로 대답합니다. "몰라, 그게 뭐야." 그 대답,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 비참한 대답은, 적어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이 아니고서는 다 똑같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의료선진화 같은 건 없으니까요. 있다면 아무개 동료 의사가 오늘 외래진료를 몇 건 처리했다는 문자나 보내고 있는 기업형 영리추구형 대형병원들로 대표되는 '의료산업'(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의 신자유주의일 겁니다. 이 산업은 공장(병동)을 커다랗게 지어 놓고 전문 의사(인력)들을 닥치는 대로 들여와 로봇 수술기 따위의 고정자본을 들여놓고 그 자본의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로봇 수술기를 이용하도록 의사들에게 유무형의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3분에 한 명씩 환자를 받고, 그들에게 불필요한 시술도 함께 '구매'하도록 팜플렛까지 만들어 가며 '영업'하고, 일반병동과 VIP병동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가격차별'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은 느닷없이 소비자, '고객님'으로 과분하게 격상되어 동네 병원에서 '무조건 쎄게' 처방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 없으면 "안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국회 발언 말마따나. 아니면 <사랑의 리퀘스트>에 나가서 구걸 아닌 구걸을 하든지 말이죠.
(삭제)
감독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의사로서, 의료생협에 몸담은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사랑의 리퀘스트> 시청자로서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광고가 범람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초반부에서, 오로지 병원 간판으로만 즐비하게 도배된 빌딩가를 지나가며 보여주는 장면은, 감독이 얼마나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오랫동안 이 하얀 정글을 보아두었느냐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자료 조사도 꽤나 간담 서늘합니다. 자료화면이 TV에 나가고 있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인용한 효과도 전 개인적으로 좋게 봤고, 특히 SERI 보고서와 기획재정부 내부문건 내용이 글자 그대로 똑같은 장면은 가관이죠. 내부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잡지 못할 촬영앵글.

다큐멘터리로서는, 일정량 이상 사용된 교차편집이나 음악의 활용, 약간의 페이크나 연출 장면 등이 보여 전형적인 포스트 다큐멘터리 저널리즘을 보여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독님께 사과합니다. 그때 뻔히 다큐인 걸 공짜로 봐놓고서 다큐는 될 수 없다고 말한 건 말실수였어요.) 한국판 <앓던이(SiCKO)>라는 명성에 걸맞게 유머감각도 적당히 삽입되어 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그래도 근대사의 인물이신데 좀 너무했지 않습니까?ㅋㅋㅋ 하여간 웃음 포인트도 가끔 있고, 그러다가도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찬송가를 삽입하는 등 대체로 꽤나 진지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컷은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나가며 그저 웃는 웃음을 보여주는 등 끝까지 긍정적입니다. 사실 세세한 내용 자체는 어쩐지 그럴 것 같았다는 대목이 많아(그리고 어째선지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잘 기억나지 않아요. 영화 상영 후 가진 제 일생 최초의 감독과의 시간에서 들은 대로라면 "다른 것보다 현 실태를 알려주는 데 가장 큰 힘을 들였다"고 하니...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한 것은 아쉽고 또 아쉬운 대목. (의료생협 하나 솔깃한 게 있었는데 그마저도 말이 좋지 영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질문해 보았습니다. 영화에 일관되게 삽입된 '천장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은, '의료혜택'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그것도 맞고, 무엇보다 트리클다운 이론을 부정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뭐가 깨달아졌습니다만, 그 뒤로 이어지는 설명들은 역시 2% 부족했습니다. 낙숫물을 간신히 손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손을 털어버려라, 그리고 물을 떨어뜨려 준다는 천장을 부셔버리자. 그리고 쏟아지는 물세례를 받아보자. 염원의 서정성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리얼리스틱한 서사는 담보하지 못한 채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설명을 해야 하는 순간 삽화라는 건 의미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것까지도 총합하여 참말로 현직 의사가 바라본 냉엄한 현실(과 현실적 제작여건). 그리고 그렇기에 더더욱 부정하고 싶고 내부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저 멀겋게 허연 밀림.
평점은 매기지 않습니다.
11월 초에는 이 영화가 제대로 배급되는 걸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무조건 가서 돈 내고 보십쇼. 제작비 7천만원이었다 하니 독립다큐 손익분기 넘겨서 이슈를 만드는 걸 기어코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참 <앓던이> 번역도 그렇고 어째선지 의료복지 문제를 자꾸 접하게 되네요. 나중에 이 바닥으로 절 돌려막기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P.s 사정상 사진을 지우게 된 얼굴들은 극장 개봉관과 공동체상영을 찾아가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 의사들, 환자들, 간호사들을 예상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2 다른 이들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그단남이아 ePUB (0) | 2011.09.22 |
|---|---|
| 오오미 영화표값 벌어야것네 (0) | 2011.09.21 |
| 허벅지! 오토튠 목소리! 그녀가 왔다! (0) | 2011.09.03 |
| <마당을 나온 암탉> (명필름+오돌또기, 2011) ※스포일러! (0) | 2011.08.06 |
| 니 상식이 부족한 이유를 말해줄께 (0) | 2011.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