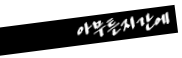일본에 와 보기 전에는 '영어회화(English Conversation)'라는 말을 그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었다. 물론 이 두 낱말이 어떻게 해서 복합명사화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중략)
판에 박힌 듯한 강의가 조금도 다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얀 벽에는 예의 그 디즈니랜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다섯 명의 젊은 사무직 여성들이 얌전을 빼고 나란히 한 줄로 앉아 있었다. 미국인 여자 선생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 여성들은 그 앞에서 다음과 같은 레슨을 합창하고 있었다.
(중략)
A: Shall we go to the soda fountain?
B: What's the soda fountain?
A: Well, Most drugstores have a soda fountain where you can get icecream, soft drinks, sandwiches, and so on.
B: OK, Let's go. I'm hungry. I'd like to get a hamburger and a milkshake.
나는 이 여섯 명의 인간이 서로의 사이에 무슨 뚫을 수 없는 벽 같은 것을 두고 서로를 진지하게 응시하며 이런 문장들을 복창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초현실주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허구의 미국식 약국과 거의 전설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진짜' 햄버거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던가? 정작 가치 있는 이야깃거리가 이밖에도 얼마나 무궁무진할 텐데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니, 이것은 미국문화의 진면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문화의 빈곤성만을 과시하는 격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 이 회화반 수강생들을 이같은 미국의 문화적 불모성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게 하지 않고 영어회화학원으로 잡아끄는 이유가 바로 이 끝없이 계속되는 약국, 슈퍼마켓, 드라이브인 영화관, 햄버거 판매점 이야기들 때문이라면, 이거야 참으로 낯간지러운 일이 아닌가?
(중략)
이때였다. 누군가 다가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실례합니다. 영어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느닷없는 불청객에 왈칵 짜증을 느꼈지만 "물론이죠"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는 그 판에 박은 질문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Where are you from?
How long have you been in Japan?
Are you sightseeing in Kanazawa?
Can you eat Japanese food?
Do you understand what this ceremony is about?
그가 쏘아대는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 때문에, 나는 은은한 종소리와 차가운 밤 공기 내음으로부터 밀려나와 그 뚫을 수 없는 쇄국의 벽 저편으로 내동대이쳐졌다. 그의 이런 질문은 "I have a book"이라는 무의미한 소리와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전혀 걸맞지 않은 것이었다. 그의 질문은 사실상 건성이랄 수밖에 없었고, 또 나의 대답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는 나라는 개인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그려져 있는 외국인의 표상에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이었다.
(후략)
집에 사 둔 좋은 책들 냅두고 강의교재 한 권도 안 샀으면서 괜히 빌려다 읽기 시작했다.
재미있고 좋은 줄은 알겠는데 읽기 싫어지면 그건 독서능력 낙제인가...